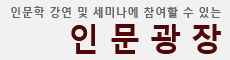미셸 푸코와 자기 변형의 기술
우리 자신의 역사적·비판적 존재론
푸코의 작업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각의 진리 개념들이 구성된 역사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삼는데, 푸코는 이런 역사를 진리의 정치사political history of truth라고 부릅니다. 푸코는 이런 진리의 정치사 혹은 서구 합리성의 한계와 조건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위해 지식·권력·윤리라는 세 영역과 고고학·계보학이라는 두 방법론을 조합해, 지식의 고고학, 권력의 계보학, 윤리의 계보학으로 나눕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1960년대 지식의 고고학 시기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지요.
1. 지식의 고고학
푸코는 1961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광기의 역사》라는 제명으로 출간합니다.그런데 말년의 푸코가 스스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 책은 아직 자신만의 탐구 영역 혹은 방법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시기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푸코 자신의 구분을 따른다면, 푸코는 자신의 첫 번째 시기인 ‘지식의 고고학’에 해당되는 책으로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1963),《말과 사물: 인간과학의 고고학》(1966) 그리고 《지식의 고고학》(1969) 세 권을 들고 있습니다. 모두 ‘고고학’이라는 말이 책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알아보기 편리하지요. 이 시기의 푸코는 글자 그대로 ‘지식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은 물론 《말과 사물》입니다. 푸코가 원래 이 책에 붙이고 싶어 했던 제목은 ‘사물의 질서’인데, ‘말과 사물’과 ‘사물의 질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뜻이 읽힙니다. 이 책은 말과 사물이 어떻게 각각의 시대마다 달리 배치되면서 그에 따라 어떻게 사물에 질서가 부여되는가를 다루고 있죠.
달력도 지도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푸코는 이 책에서 자신의 탐구 지역을 서유럽으로, 탐구 시기를 16세기 이래 자신이 이 책을 쓰던 20세기 중반까지로 엄격히 한정합니다. 푸코에 따르면,16세기 이래 서유럽 문화에는 오직 두 번의 단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6세기 초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르네상스’ 시기이고,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가 ‘고전주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래 ‘근대’가 되는데, 푸코에 따르면 이 책이 발표된 20세기 중반은 여전히 ‘근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푸코는 각 시기마다 지식이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바로 그 방식으로 배치되게 만드는 하나의 원리, 혹은 하나의 에피스테메 곧 인식론적 장場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푸코에 따르면, 각 시대는 오직 하나의 에피스테메만을 갖는데,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는 ‘유사성ressemblance’, 고전주의는 ‘재현representation’, 근대는 ‘역사histoire’입니다. 근대의 이 ‘역사’는 사실상 경험적-선험적 이중체doublet empirico-transcendantal로 이해되는 ‘인간homme’과 같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는 시대에 따라 진리와 인식의 모든 틀, 구조 자체가 달라지며, 이들 역사를 가로지르는 보편적 진리와 같은 것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사회에 있어서의 각각의 주어진 시기에 대한 지식의 고고학적 지층地層입니다. 지식의 고고학이란 마치 물건 곧 유물遺物의 고고학이 있듯이 지식에도 지층이 있으며 하나의 개념 혹은 단어는 자신이 속하는 지층의 내부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주의적 함축’을 갖는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시기는 그것이 변화의 이유나 동인動因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새로운 단계 곧 권력의 계보학 시기로 이행합니다.
2. 권력의 계보학
권력의 계보학 시기에 속하는 책들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푸코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저서인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1975)입니다.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은 권력의 계보학이 이전 시기의 지식의 고고학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푸코는 이전의 지식을 버리고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지식pouvoir-savoi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늘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력-지식의 복합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푸코는 어떤 하나의 이전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이전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기존의 개념을 부분 집합으로 넣습니다. 즉 지식의 고고학과 권력의 계보학의 관계는 사람들이 말하는 연속도, 단절도 아닌, 포괄이라고나 할까요. 마찬가지로 1960년대의 에피스테메는 1970년대 중, 후반에 들어 ‘장치dispositif’라는 개념에 포섭되면서 담론적 장치가 되고, 담론적 장치가 아닌 다른 부분은 크게 ‘제도institution’라고 불리게 됩니다. 곧 에피스테메는 장치의 담론적 부분을, 제도를 포함한 다른 부분은 장치의 비담론적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고학은 계보학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푸코의 1970년대 권력의 계보학 시기는 사실상 권력과 계보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권력-지식의 고고학-계보학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권력-지식인데 ,이 개념은 때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권력-지식은 ‘권력이 지식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 푸코가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대표적 오류 중 하나로 권력-지식을 푸코가 부정하는 기존의 실체적 권력관에 입각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푸코는 기존의 권력관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모두 권력을 하나의 실체, 하나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비판합니다.
우선 권력이 실체가 아니라 함은, 기존의 국가 혹은 정당 단위의 거시적 정치만이 진짜 정치라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거시적 실체적 권력관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전복 및 혁명 혹은 대통령 바꾸기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정치고, 개인의 정체성 투쟁, 가령 동성애, 장애인, 외국인, 여성주의 담론 등은 그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을 근본적이자 미시적인 사소한 일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관점은 하나의 오류라고 봅니다. 이에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러한 푸코의 관점이 미시적인 작은 권력들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권력의 거시적 차원을 방기放棄한다 혹은 그러한 차원에 대해 무력하다는 비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푸코의 미시 권력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푸코의 미시 권력관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이 탄생한다고 주장하며, 거시적 것은 이러한 무한하게 작은 미시적 권력들의 효과로서 드러나는 권력 현상의 가장 가시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푸코에게 거시 권력은 미시 권력이라는 보다 커다란 권력에 모두 포함되는 가장 가시적인 영역입니다. 마치 뉴턴의 거시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완전히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한 함수로서 일정한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거시 정치는 미시 정치의 한 부분, 그러나 가장 가시적인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푸코는 거시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거시 권력에만 집중하다보면 미시 권력의 다양한 저항 지점들을 놓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자, 거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동기나 이유 자체도 결국은 일상의 미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관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소유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은, 기존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모두 권력을 획득, 탈취, 양도, 혹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 소유물처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푸코는 기존의 권력관이 권력을 계약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주의, 혹은 권력을 경제라는 하부구조의 부산물인 상부구조로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경제주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곧 권력이란 이렇게 양도 혹은 탈취 가능한 하나의 경제적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푸코가 권력-지식론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권력에 대한 이러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려는 푸코의 이런 작업은 마치 중세의 철학, 신학, 윤리로부터 정치를 독립시킨 마키아벨리가 했던 일을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를 경제의 시녀라는 지위로부터 독립시켜 하나의 자율적 단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푸코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체적이지도 경제에 종속적이지도 않은 권력은 ‘주어진 상황에 존재하는 요소들 사이의 전략적 배치(에 의해 파생되는 효과)’로서 새롭게 정의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권력-지식은 ‘권력이 지식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반대로 지식은 권력에 초연해야 한다든가, 혹은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든가’라는 식의 전통적 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이 됩니다. 권력은 한마디로 ‘담론적 및 비非담론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적 상황의 총체’, 곧 권력관계입니다. 이른바 대문자 ‘권력le Pouvoir’이라는 단수의 소유 가능한 실체는 없고, 오직 다양한, 사실상 무한한 전략적 상황의 총체에서 발생하는 복수複數의 권력관계들relations de pouvoir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권력-지식은 권력의 측면에서 무한하고 다양한 복수의 권력관계들을 낳는 것처럼, 지식 혹은 진리의 측면에서는 (권력 혹은 욕망과 분리된 이른바 ‘객관적 진리’가 아닌) 오직 정치적·역사적으로 구성된 진리 곧 진리의 정치사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감시와 처벌》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른바 서구 근대 사회를 형성한 다양한 역사적 지점들에 작용하는 권력-지식에 대한 미시 정치적 분석입니다.
3. 윤리의 계보학
한편 푸코는 대략 1977~1978년을 계기로 이러한 권력의 계보학을 넘어서는 윤리의 계보학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심의 첫 작업은 1976년에 나온 ‘성의 역사’ 시리즈 1권 《지식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심 및 방향 전환을 거쳐 자신이 사망하던 1984년에 시리즈의 2, 3권인 《쾌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를 출간하게 됩니다. 푸코는 이러한 전환을 맞게 된 이유를 대략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나는 지식과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1960년대 내가 지식의 고고학이라 이름 붙인 작업을 통해 수행했다. 그리고 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1970년대 초중반 이른바 권력의 계보학을 통해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체가 어떻게 하나의 도덕적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게 되는가라는 주체화의 문제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푸코,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자아에의 배려, 권력, 자아, 윤리〉, 정일준·황정미 외 옮김,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새물결, 1994, 100~104쪽 참조)윤리의 계보학은 하나의 주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도덕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의 윤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윤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에토스ethos(태도 혹은 성격)가 갖는 원래의 의미, 곧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기와 자기의 관계는 자기 배려의 윤리를 낳게 됩니다. 푸코는 죽기 직전인 1984년 1월에 행한 대담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자기 배려의 윤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배려하기 이전에 타인을 배려해서는 안 됩니다.자기와 자기의 관계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한,도덕적으로도 우선합니다.”(이광래,《미셸 푸코》,민음사 1989,301쪽)이것을 좀 단순화시켜 말해보자면,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만 다른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배려하기 이전에 타인을 배려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때의 자기 배려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며, 다만 참다운 자기 배려일 뿐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오늘 저녁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친구에게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날 내가 억지로 나가게 된다면 나는 그 친구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나라면 과연 나의 친구가 그런 상황일 때 억지로라도 약속에 나오기를 바랄까요?
푸코의 윤리의 계보학은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혹은 됐는가? 라는 주체화subjectivation 곧 주체의 역사적 형성historical formation of the subject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가령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태어난 시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겪은 어떤 사건 (가령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든가 혹은 왕따를 당했다든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가령, 플라톤이 없었다면 오늘의 서양은 어떤 지역이 됐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다면 가톨릭의 교리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따라서 대한민국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나 할까요?
다시 개인의 주체화로 돌아오면, ‘성의 역사’ 시리즈에서 푸코는 개인이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설립하는 방식의 역사, 곧 윤리적 문제화의 역사를 분석합니다. 문제화problematisation란 주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인 주체화, 대상이 설정되는 방식인 대상화objectivation, 그 사이의 인식이 확립되는 과정인 인식론화epistemologisation를 모두 합해 부르는 푸코의 포괄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화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과정, 혹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문제화되기 이전의 어떤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문제인 것을 다시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아닌 것, 한마디로 푸코의 용어를 따르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역사적·정치적으로 구성됐다고 보는 푸코에게 이른바 정상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것’이란 푸코에게 ‘기존의 정상을 밀어내고 정상의 자리에 새롭게 등극한 어떤 무엇’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 푸코는 정상화normalisation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보시다시피 현대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규범화, 획일화, 규칙화 등등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여하튼 1970년대 중반 이래 푸코의 철학적 적敵은 한마디로 이 정상화입니다. 정상이란 없고 오직 정상들만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기준들이며, 정상이란 오직 정상 게임, 정상 놀이에서 승리한 지배적인 정상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 푸코 주장의 함축입니다. 이는 진리의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란 오직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을 뿐인 진리, 곧 지배적이 된 진리로서, 사실은 무수한 진리 놀이들jeux de verite 중 단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 중 일부)
★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